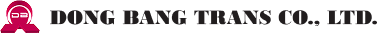KIC 글로벌 기자단 소식
마타리키와 추석. 기억의 구조와 공동체의 미래를 묻다.
- 박춘태
- 41
- 11-16
뉴질랜드지회 박춘태 기자
뉴질랜드의 겨울 하늘에 떠오르는 마타리키(Matariki) 별무리와 한국의 가을밤을 밝히는 추석의 보름달은, 각각의 공동체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에 대한 흥미로운 비교를 제공한다.
마오리 전통에서 마타리키는 조상을 기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의례였지만, 오늘날 뉴질랜드 사회는 이를 국가적 차원의 기억의 공공성 및 공동체 치유를 구현하는 장치로 발전시켰다. 별무리가 다시 나타날 때마다 공동체는 잃어버린 이들을 추모하고, 남은 이들의 번영을 기원하며, 사회 전체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는 단순한 공휴일을 넘어, 사회적 기억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성숙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마타리키의 의미는 타카푸네케(Takapūneke) 지역의 사례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1830년 식민지 시대의 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기록된 이곳은, 최근 마오리와 파케하(유럽계 뉴질랜드인)가 협력하여 생태 복원과 역사적 치유를 병행하는 장소로 거듭났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토착 식물을 심고 땅의 상처를 회복시키며, 과거의 비극을 숨기지 않고 공공의 영역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방식은 기억을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확장하는 과정아다. 상처를 다루는 방식이 공동체의 성숙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타카푸네케의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의 추석 역시 하늘을 매개로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을 이어가는 전통을 담고 있다. 보름달 아래 가족이 모여 조상을 기리고, 성묘와 차례를 지내며 한 해의 감사와 풍요를 나누는 추석은 가족 단위의 결속을 강화하는 기능을 중심에 둔다. 그러나 그 기억의 범위는 주로 친족과 가족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 사회 전체의 공적 치유나 광범위한 기억적 기능과는 다소 결이 다른다. 이 점에서 마타리키는 개인과 가족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고, 상처를 숨기지 않으며, 사회의 회복력을 함께 구축하는 보다 사회적 범위의 기억과 치유를 강조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마타리키와 추석의 비교는 전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는 해외 한민족 공동체에게 중요한 과제를 제시한다.
해외 한인사회는 정체성 유지, 세대 간 연결, 문화 전승, 이민 역사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공통적으로 마주하며, 이를 해결하는 핵심은 '기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달려 있다. 마타리키가 보여주는 기억의 공공성, 공동체가 함께 치유하는 구조, 그리고 미래세대를 중심에 둔 사고방식은 해외 한민족 공동체가 연대를 강화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적용 가능한 가치다.
한국의 추석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해석을 담아낼 수 있다. 조상과 가족 중심의 의미를 존중하되, 이민의 역사, 지역사회와의 관계, 공동체의 상처와 갈등 등 보다 현대적이고 확장된 기억의 요소를 담아낸다면, 추석은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될 것이다.
마타리키가 사회적 치유와 공공의 연대를 강화하는 '기억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면, 추석은 공동체 정(情)과 가족적 유대를 확립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공동체의 지속성과 미래를 준비하게 한다.
하늘의 별과 달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공동체가 과거를 어떻게 떠올리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묻는 상징적 언어다. 마타리키가 보여주는 치유의 구조와 추석이 지닌 공동체 정신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 한민족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속하고 더 넓은 연대를 향해 나아가는 데 의미 있는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의 재해석과 확장은 공동체의 미래를 탄탄하게 만드는 중요한 문화적 토대가 될 것이다.
뉴질랜드의 겨울 하늘에 떠오르는 마타리키(Matariki) 별무리와 한국의 가을밤을 밝히는 추석의 보름달은, 각각의 공동체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에 대한 흥미로운 비교를 제공한다.
마오리 전통에서 마타리키는 조상을 기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의례였지만, 오늘날 뉴질랜드 사회는 이를 국가적 차원의 기억의 공공성 및 공동체 치유를 구현하는 장치로 발전시켰다. 별무리가 다시 나타날 때마다 공동체는 잃어버린 이들을 추모하고, 남은 이들의 번영을 기원하며, 사회 전체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는 단순한 공휴일을 넘어, 사회적 기억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성숙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마타리키의 의미는 타카푸네케(Takapūneke) 지역의 사례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1830년 식민지 시대의 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기록된 이곳은, 최근 마오리와 파케하(유럽계 뉴질랜드인)가 협력하여 생태 복원과 역사적 치유를 병행하는 장소로 거듭났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토착 식물을 심고 땅의 상처를 회복시키며, 과거의 비극을 숨기지 않고 공공의 영역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방식은 기억을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확장하는 과정아다. 상처를 다루는 방식이 공동체의 성숙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타카푸네케의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의 추석 역시 하늘을 매개로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을 이어가는 전통을 담고 있다. 보름달 아래 가족이 모여 조상을 기리고, 성묘와 차례를 지내며 한 해의 감사와 풍요를 나누는 추석은 가족 단위의 결속을 강화하는 기능을 중심에 둔다. 그러나 그 기억의 범위는 주로 친족과 가족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 사회 전체의 공적 치유나 광범위한 기억적 기능과는 다소 결이 다른다. 이 점에서 마타리키는 개인과 가족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고, 상처를 숨기지 않으며, 사회의 회복력을 함께 구축하는 보다 사회적 범위의 기억과 치유를 강조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마타리키와 추석의 비교는 전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는 해외 한민족 공동체에게 중요한 과제를 제시한다.
해외 한인사회는 정체성 유지, 세대 간 연결, 문화 전승, 이민 역사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공통적으로 마주하며, 이를 해결하는 핵심은 '기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달려 있다. 마타리키가 보여주는 기억의 공공성, 공동체가 함께 치유하는 구조, 그리고 미래세대를 중심에 둔 사고방식은 해외 한민족 공동체가 연대를 강화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적용 가능한 가치다.
한국의 추석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해석을 담아낼 수 있다. 조상과 가족 중심의 의미를 존중하되, 이민의 역사, 지역사회와의 관계, 공동체의 상처와 갈등 등 보다 현대적이고 확장된 기억의 요소를 담아낸다면, 추석은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될 것이다.
마타리키가 사회적 치유와 공공의 연대를 강화하는 '기억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면, 추석은 공동체 정(情)과 가족적 유대를 확립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공동체의 지속성과 미래를 준비하게 한다.
하늘의 별과 달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공동체가 과거를 어떻게 떠올리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묻는 상징적 언어다. 마타리키가 보여주는 치유의 구조와 추석이 지닌 공동체 정신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 한민족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속하고 더 넓은 연대를 향해 나아가는 데 의미 있는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의 재해석과 확장은 공동체의 미래를 탄탄하게 만드는 중요한 문화적 토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