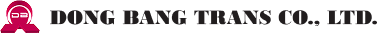KIC 글로벌 기자단 소식
뉴질랜드 더니든에서 마주한 역전의 순간, 은메달의 의미
- 박춘태
- 94
- 09-22


뉴질랜드지회 박춘태 기자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남쪽으로 여섯 시간을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도시, 더니든(Dunedin). 계절의 바람이 바뀌는 9월, 필자는 이 도시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 오랜 유학 시절의 추억이 서려 있는 더니든은 나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또 다른 고향과 같은 정서적 공간이다. 바로 이곳에서 열린 남섬 지역 탁구대회(South Island Clubs NZ Table Tennis 2025 Championship Tournament)에 출전하게 된 것이다.
이번 대회는 9월 19일과 20일, Dunedin Metropolitan Club Inc가 주관하고 Dunedin Metro가 주최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졌다. 남섬 전역에서 모인 10여 개 팀,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공식적인 남섬의 탁구 클럽은 약 19개, 소속 회원은 600여 명에 달한다. 규모 면에서는 북섬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있으나, 남섬 대회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공동체적 뿌리를 지니고 있다. 이 지역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남섬 탁구 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장이기도 하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탁구는 생각보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세기 초 유럽계 이민자들과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이 함께 보급하면서, 남섬 도시별 클럽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중 더니든과 크라이스트처치는 특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중심지였다. 남섬 지역 대회가 본격적으로 체계를 갖춘 것은 1970년대 이후다. 그때부터 해마다 클럽들이 모여 남섬 최강자를 가리는 전통이 이어졌고, 이 흐름 속에서 세대와 국적을 넘는 다양한 선수들이 함께 땀을 흘려왔다. 이번 2025년 대회 또한 그 역사의 연장선에서, 세월이 켜켜이 쌓인 의미를 품고 있었다.
필자에게 이번 무대는 첫 공식 출전이었다. 경기는 A grade부터 D grade까지 다양한 레벨로 나뉘었으며, 출전 선수들의 연령대는 무려 20대에서 80대까지 이어졌다. 한 공간에서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똑같이 라켓을 쥐고 흰 작은 공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남섬 대회의 특별함을 웅변하고 있었다.
필자가 참가한 것은 B grade 경기였다. 사실 출전만으로도 충분히 떨리고 벅찬 경험이었지만, 경기가 이어지면서 긴장과 설렘은 점점 더 깊어졌다. 한국인 출전자는 필자가 유일했지만, 코트 바깥에서 들려오는 격려와 따뜻한 환대는 낯설지 않았다. “팀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동료들의 말은 그 어떤 트로피보다 값졌다.
특히 드라마 같은 순간은 단식 경기에서 찾아왔다. 초반에 0대2로 뒤지고 있을 때, 정말로 “여기서 끝인가”라는 체념이 마음을 스쳤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다시 손에 힘을 불어넣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흐름 속에서 한 점씩 따라붙었고, 지쳐가는 몸을 붙잡으며 집중력을 되살렸다. 결국 3대2의 역전승. 관중석에서 터져 나온 환호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감격이 온몸을 채웠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소 연습에서는 단식 승률이 고작 10% 정도였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80%에 가까운 성과를 내었다. 숫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기적이었다. 더니든의 경기장은 나 스스로에게 보내는 분명한 신호,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체험의 현장이었다.
우리 팀은 최종적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대회 규모나 클럽 간의 경쟁 구도를 생각하면 이는 참으로 값진 성과였다. 무엇보다 팀원들과 웃으며 함께 목에 건 은메달은 단순한 승리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공동체의 선언이었다.
탁구는 흔히 개인 스포츠로 인식되지만, 실제 대회에서 느낀 것은 그것이 단순한 개인의 승부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서로의 경기를 응원하고, 작은 점수 하나에도 함께 환호하고, 패배의 순간에도 등을 다독인다. 그 힘이 있었기에 초반 열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비록 혼자 출전한 듯 보였지만, 코트 위의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것이 은메달의 진짜 의미였다.
더니든이라는 도시의 배경 또한 이번 경험을 특별하게 했다. 스코틀랜드풍 건축물과 언덕, 바다의 풍광이 조화를 이루는 이곳은 남섬에서 가장 유럽적 정서를 간직한 도시라 불린다. 그곳에 깃든 유학 시절의 기억은 이번 대회를 더욱 감정적으로 물들였다. 경기장의 환호성과 함께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순간이 기묘하게 포개졌고, 그 만남 자체가 어떤 인연처럼 느껴졌다.
더니든은 역사적으로도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해왔다. 럭비, 크리켓, 하키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일지라도 탁구 같은 실내 스포츠가 꾸준히 자리 잡아온 곳이다. 이번 대회는 그 역사의 맥락 속에서 개인의 추억과 공동체의 전승이 교차하는 무대였다.
돌아보면 이번 경험에서 가장 큰 교훈은 단순한 승리 이상의 것이었다. 불리한 순간마다 “한 점씩 따라가자”라는 마음으로 버텼던 기억은 일상의 은유가 되었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다. 불합리한 상황, 절망처럼 보이는 벽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다잡을 때, 전혀 기대하지 못한 문이 열린다. 더니든의 경기장에서 배운 이 교훈은 지금도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날의 은메달은 하나의 완성에 머무는 메달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빛나고 있는 ‘희망의 메달’이다. 절망하지 말 것, 혼자일지라도 당당히 설 것, 그리고 도전 끝에서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낼 용기를 가질 것. 더니든은 나에게 이 세 가지를 뚜렷이 새겨준 도시이자,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선물한 곳이다.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남쪽으로 여섯 시간을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도시, 더니든(Dunedin). 계절의 바람이 바뀌는 9월, 필자는 이 도시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 오랜 유학 시절의 추억이 서려 있는 더니든은 나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또 다른 고향과 같은 정서적 공간이다. 바로 이곳에서 열린 남섬 지역 탁구대회(South Island Clubs NZ Table Tennis 2025 Championship Tournament)에 출전하게 된 것이다.
이번 대회는 9월 19일과 20일, Dunedin Metropolitan Club Inc가 주관하고 Dunedin Metro가 주최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졌다. 남섬 전역에서 모인 10여 개 팀,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공식적인 남섬의 탁구 클럽은 약 19개, 소속 회원은 600여 명에 달한다. 규모 면에서는 북섬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있으나, 남섬 대회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공동체적 뿌리를 지니고 있다. 이 지역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남섬 탁구 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장이기도 하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탁구는 생각보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세기 초 유럽계 이민자들과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이 함께 보급하면서, 남섬 도시별 클럽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중 더니든과 크라이스트처치는 특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중심지였다. 남섬 지역 대회가 본격적으로 체계를 갖춘 것은 1970년대 이후다. 그때부터 해마다 클럽들이 모여 남섬 최강자를 가리는 전통이 이어졌고, 이 흐름 속에서 세대와 국적을 넘는 다양한 선수들이 함께 땀을 흘려왔다. 이번 2025년 대회 또한 그 역사의 연장선에서, 세월이 켜켜이 쌓인 의미를 품고 있었다.
필자에게 이번 무대는 첫 공식 출전이었다. 경기는 A grade부터 D grade까지 다양한 레벨로 나뉘었으며, 출전 선수들의 연령대는 무려 20대에서 80대까지 이어졌다. 한 공간에서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똑같이 라켓을 쥐고 흰 작은 공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남섬 대회의 특별함을 웅변하고 있었다.
필자가 참가한 것은 B grade 경기였다. 사실 출전만으로도 충분히 떨리고 벅찬 경험이었지만, 경기가 이어지면서 긴장과 설렘은 점점 더 깊어졌다. 한국인 출전자는 필자가 유일했지만, 코트 바깥에서 들려오는 격려와 따뜻한 환대는 낯설지 않았다. “팀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동료들의 말은 그 어떤 트로피보다 값졌다.
특히 드라마 같은 순간은 단식 경기에서 찾아왔다. 초반에 0대2로 뒤지고 있을 때, 정말로 “여기서 끝인가”라는 체념이 마음을 스쳤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다시 손에 힘을 불어넣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흐름 속에서 한 점씩 따라붙었고, 지쳐가는 몸을 붙잡으며 집중력을 되살렸다. 결국 3대2의 역전승. 관중석에서 터져 나온 환호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감격이 온몸을 채웠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소 연습에서는 단식 승률이 고작 10% 정도였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80%에 가까운 성과를 내었다. 숫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기적이었다. 더니든의 경기장은 나 스스로에게 보내는 분명한 신호,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체험의 현장이었다.
우리 팀은 최종적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대회 규모나 클럽 간의 경쟁 구도를 생각하면 이는 참으로 값진 성과였다. 무엇보다 팀원들과 웃으며 함께 목에 건 은메달은 단순한 승리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공동체의 선언이었다.
탁구는 흔히 개인 스포츠로 인식되지만, 실제 대회에서 느낀 것은 그것이 단순한 개인의 승부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서로의 경기를 응원하고, 작은 점수 하나에도 함께 환호하고, 패배의 순간에도 등을 다독인다. 그 힘이 있었기에 초반 열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비록 혼자 출전한 듯 보였지만, 코트 위의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것이 은메달의 진짜 의미였다.
더니든이라는 도시의 배경 또한 이번 경험을 특별하게 했다. 스코틀랜드풍 건축물과 언덕, 바다의 풍광이 조화를 이루는 이곳은 남섬에서 가장 유럽적 정서를 간직한 도시라 불린다. 그곳에 깃든 유학 시절의 기억은 이번 대회를 더욱 감정적으로 물들였다. 경기장의 환호성과 함께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순간이 기묘하게 포개졌고, 그 만남 자체가 어떤 인연처럼 느껴졌다.
더니든은 역사적으로도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해왔다. 럭비, 크리켓, 하키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일지라도 탁구 같은 실내 스포츠가 꾸준히 자리 잡아온 곳이다. 이번 대회는 그 역사의 맥락 속에서 개인의 추억과 공동체의 전승이 교차하는 무대였다.
돌아보면 이번 경험에서 가장 큰 교훈은 단순한 승리 이상의 것이었다. 불리한 순간마다 “한 점씩 따라가자”라는 마음으로 버텼던 기억은 일상의 은유가 되었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다. 불합리한 상황, 절망처럼 보이는 벽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다잡을 때, 전혀 기대하지 못한 문이 열린다. 더니든의 경기장에서 배운 이 교훈은 지금도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날의 은메달은 하나의 완성에 머무는 메달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빛나고 있는 ‘희망의 메달’이다. 절망하지 말 것, 혼자일지라도 당당히 설 것, 그리고 도전 끝에서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낼 용기를 가질 것. 더니든은 나에게 이 세 가지를 뚜렷이 새겨준 도시이자,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선물한 곳이다.